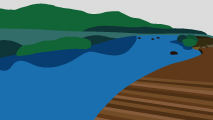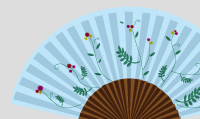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섭지코지 가려면 분명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섭지코지 근처도 못 간 것 같다. 심지어 이곳은 멋들어진 해안도로.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를 태운 사내들이 벌써 몇 번이고 내 곁을 지나갔다. 서울에서는 오픈카 근처에도 못 갈 것들이, 여기서 빌려다가 원 없이 기분 내는 거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트렉킹화 살 돈으로 오픈카 렌트나 할걸. 문득 손에 쥔 올레길 지도를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 구질구질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오늘따라 카메라는 왜 이리 무거운지. 명색이 카메라맨이라고 고민할 것도 없이 DSLR을 챙겨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똑딱이 가져올 걸 그랬다. 아, 여기서 작아지지 말자. 오늘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로 한, 마지막 날이니까.
대학 졸업 후, 6년 내내 사진 전공한 것을 후회했다. 돈 있는 친구들은 모두 프랑스며, 미국이며 유학 가서 예술가 타이틀을 따왔지만, 돈 없는 나는 그저 사진으로 먹고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다, 결국 베이비 포토에 안착했다.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좋아하는 편이니까.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딸랑이를 들었다. 알바로 시작해서 자리 잡은 지 이제 4년. 입소문이 나서 나름 예약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내 사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단 하루만 고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찍자. 만족할 만큼 찍은 다음, 고객의 사진사로 돌아가자. 부끄럽게도 삼십 여년을 살면서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촬영지를 무작정 제주도로 잡았다. 그러나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현장에 와서야 그걸 깨달은 것이다.
한참을 걸었더니 섭지코지가 보였다. 여기가 드라마 ‘올인’에서 송혜교랑 이병헌이 정분난 곳이란 말인가? 막상 왔더니 드라마 장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구먼. 제기랄. 제기랄! 감흥도 없는데 왜 왔단 말인가! 아, 그래도 저기 바다가 있네. 좋긴 좋구먼. 와글거리는 일본인들과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해안선을 배경으로 셀카 한 장을 박았다. 열 방 찍었더니 한두 장 정도 건질만 했다. 그래, 이제 가자. 그나저나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몇 코스인지도 모르고 한참을 걸었더니 포구가 하나 나왔다. 스마트폰 지도를 켜보니 ‘대평포구’라고 한다. 친절도 하지.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그리고는 또 한참을 걸었다. 포구에 다다르고 나서부터 급격히 어둠이 찾아왔다. 서귀포는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육지보다 문을 일찍 닫는다고 들었다. 슬슬 목 뒤로 찬 기운이 올라왔다. 점퍼 지퍼를 턱밑까지 올렸다. 폼 안나는 건 알지만, 거리에 사람 자체가 없는데 뭐.
정말 대부분의 카페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블라인드를 치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당장 밥은 둘째 치고, 오늘밤 잘 곳이 갈급했다. 빠른 걸음으로 경보하듯 길을 걸으니, 드디어 밝은 가게 하나가 나타났다. 카페 ‘오름’. 오름이 뭐지? 어쨌든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이자.
“여기 아직 영업하시나요?”
그러자, 머리가 희끗한 사내가 주방에서 나왔다.
“손님이 오셨으니, 닫기는 글렀네요.”
따뜻한 커피를 시키고, 의자에 앉았다. 커피 한 모금에 찬 기운이 가시자, 그제야 카페 내부가 들어왔다. 카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하얗게 페인트칠 된 벽 한가운데에 사진 하나가 떡하니 걸려있었다. 자연풍경 같기는 한데, 잔디밭이라고 하기엔 좀 높고, 언덕이라고 하기엔 좀 나지막했다. 그 풍경이 흡사, 흡사…….
“여자 가슴 같죠?”
카페 주인의 직격타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 예. 예……. 저기, 이게 어디죠?”
“어디긴. 여기지. 제주예요. 오름. 우리 가게 이름, 오름.”
“오름?”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작은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해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데, 이놈이 오름 사진을 꼭 이렇게 야릇하게 찍더라고. 나도 이 녀석 때문에 오름에 빠져서 가게 이름을 이리 지었다니까요.”
“이놈이라면, 혹시 이 사진 찍은 분과 아는 사이세요?”
내 질문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씁쓸한 미소가 잠시 그의 입가에 머무는가 했더니,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친구예요. 김영갑. 근데 이제 없어. 죽었거든.”
그의 대답에 나는 잠시 머리가 띵해졌다. 간만에 정말로 매력적인 사진을 찾았는데, 작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아니, 왜요?”
“왜긴 왜야. 저런 거 찍느라고 만날 밥도 굶고 노숙하느라 몸이 닳고 닳아서 그렇지. 그 인간은 제주에 미친놈이었거든. 그러고 보니 자네도 카메라가 꽤나 좋구먼. 저 친구도 그런 게 갖고 싶었을 텐데. 그 인간은 좋은 카메라도 기교도 없었어. 그냥 빛만 기다리며 찍었지. 자네 사진 잘 찍나?”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어쩐지 오름 사진 앞에서 스스로 카메라맨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카페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게 말했다.
“자네, 사진 찍는 사람이지? 왼쪽 눈가를 보니 대번에 알겠구먼. 주름이 자글자글 한 것이……. 잘 곳 없으면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표선에 함 가봐. 오름 사진 실컷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주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 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가. 저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고, 색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몸이 닳아 없어져도 좋을 것 같았다. 김영갑이라……. 표선에 그의 갤러리가 있다고 했지. 제주에 온지 14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제주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아니 어쩌면 가지 않을지도 모르는 오름의 실루엣 때문에. 그리고 그 오름과 사랑에 빠진 제주 남자의 이야기 때문에.